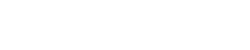이것도 직업병일까….
다른 여자들은 몸을 누르는 무게를 느낄 때 머리 속이 하얗게 빈다는데,
나는 반대로 무게를 느껴야 머리에 피가 도는 듯, 이런저런 생각들이 펼쳐진다.
전 영모…. 어제 밤에 내 몸을 뜨겁게 관통했던 사내의 이름이다.
뉴욕에서 MBA를 하다가, 때려치고 작은 수입상을 하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현재 나의 밉지 않은 기둥서방이다.
아침 아홉 시. 커튼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온다.
영모는 작게 코를 골며 내 허리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걷자 훅 하고 정액 냄새가 풍겨온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내 첫경험이 떠오른다.
고1여름, 김 유정이 살았다는 신남의 여름은 뜨겁다.
내 나이 열 다섯, 속은 아직도 윙크(만화잡지)나 끼고 다니며
히히덕거리는 어린애였지만, 유난히 일찍 성숙한 몸 덕에,
나는 언제부터인가 은근한 사내들의 불쾌한 눈초리를 받으며 다녀야 했다.
그날도 팔 월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 쪼이던 교정의 어느 구석,
인혜가 교문 앞 분식점으로 김밥을 사러 탈출하고,
나는 아이스크림콘을 두 개 사서 나무아래 벤치에 앉아있는데,
옆 반의 혁주가 다가왔다.
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3
반의 반장인 혁주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스타 중 하나였다.
나 역시도 이제나 저제나 건넬 틈만 기다리며, 러브레터를 여러 통씩 들고 다니던 터였다.
다가오는 혁주의 표정이 왠지 주춤거렸다.
난 그저 그것이 쑥스러워서 그런 거려니 생각했다.
‘강 채연….’
내 이름이다.
‘저기, 자, 잠깐 체육실까지좀 와줄래? 할 말이 좀 있는데…’
할 말?
혁주가 나한테 할 말?
나는 머리 속이 하얘져서는 마치 리모콘 로보트처럼 그의 뒤를 따라
덜컥거리며 걸어갔다. 가슴이 사정없이 뛰고 있었다.
러브레터가 분명히 가방 안쪽에 들어있었지…! 좋았어!
인혜가 김밥을 몇 줄 사온댔더라….
하지만 지금 김밥 따위 아무래도 좋았다.
끼이익…
음산한 문소리가 허공을 찢을 때, 순간 아랫도리에서 뭔가 뜨끈한 느낌이
후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윽고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실내는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문득 겁이 났다. 눈 앞에 뜀틀과, 축구공, 배구공, 탁구대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혀, 혁주야…?
그 때였다. 뜀틀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퍼뜩 놀라 돌아보니,
다섯 그림자가 불쑥 솟아 올라왔다.
난 순간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콘이 땅바닥에 떨어져 만신창이가 됐다.
‘아하하, 진짜로 잘 걸려드네!’
‘하여간 혁주만 보내면 백발백중이라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되었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에 혁주를 돌아보니,
혁주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린다.
‘됐어, 수고했다. 혁주 넌 그만 가도 돼’
그들은 우리 학교의 악명 높은 일진조직 패거리였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TV나 잡지 등에서 보던 여러 음험한 장면들이
마치 영화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돌리기도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억센 팔이
내 양 손을 낚아챘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히죽거리는 다섯 그림자.
‘너, 너희들, 왜 이래? 저리 가….’
‘왜 이러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같이 놀았는데,
슬슬 업그레이드좀 하자는데 뭐 불만이야?’
‘재밌게 놀자구. 응? 어른들처럼 말야.’
‘어른들 누구? 미용실 영자랑 붙어먹은 니 삼촌 말이냐?’
‘시끄러 새꺄~. 그 년은 걸레라서 재미 하나도 없었어. 진짜 재미는 바로 강간이라구, 강간!’
강간?!
내가 지금 강간당하는 거라구?
아직 키스도 못해봤는데?
중학교 때도 늘 같이 다니며 등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하면서 놀았던 사내애들….
난 태어나서 그 때 처음으로 사내가 무섭다는 걸 느꼈다.
사내들은 마치 바위 같았다. 양 팔을 잡아채고 있는 두 사내.
그리고 또 둘은 내 양 다리를 잡아 눌렀다.
나는 매트리스 위에 사지를 잡힌 채 대자로 누워 있었고, 그 위로 또 한 사내가 다가왔다.
넥타이가 풀리고 사내의 손이 속옷 사이로 뱀처럼 스며들어오자,
난 겨우 버둥대기 시작했다.
사내의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바짝바짝 돋고 있었다.
‘히히, 이게 앙탈대기 시작하는데?’
‘그래야지, 죽은 척 가만 있으면 재미 없다니깐.’
내가 온힘을 다해 버둥대며 비명을 질러대는 것은 내 몸의 방어를 위해서인데,
그런 몸짓조차 사내들에겐 기쁨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뭔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당시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다.
아냐 아냐! 이건 절대로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