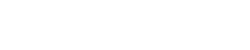남근석 - 1부
최고관리자
그룹
0
46,950
2022.11.05 02:29

남근석“이번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 “…” “여보.” “응? 뭐..뭐라 그랬어?” “이번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냐고 물었어.” “아.. 그..그래. 당신 맘대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걱정돼서 그래?” “이번에도 당신이 잘 막을 거지? 나 그건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잘 막아. 안 그러면 나 그냥 도망 나와 버릴 거야.” “후훗. 알았어. 걱정 마. 여태 내가 잘 막았었잖아.” “이번엔 왠지 어머님이 강제로라도 끌고 갈 것 같단 말이야. 예감이 안 좋아.” “어머니도 내 말은 들으시잖아.” “당신이 어머님 고집을 꺾어? 지난번에도 겨우 도망치듯이 나와놓구선..” “염려마. 이번에도 안되면 당신 데리고 도망쳐버릴 테니까. 알았지?” 영선은 남편 우석을 한번 흘겨보고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영선은 초점 없는 눈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나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귓전으로 카랑카랑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전 전화통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니 이번에는 꼭 내려오거래이. 알았제?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내 죽는꼴 볼끼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 말만 하고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미 예순을 넘긴 노인네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운이 넘쳐났다. 영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옆에서 운전을 하던 우석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말이 없었다. 답답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석은 3대 독자였다. 아들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겐 무엇보다 대를 이어야 하는 사명감이 컸다. 그것은 그녀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지어진 크나큰 책임이었다. 신혼 초만 해도 그것은 별로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사는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영선은 짓눌리고 있었다. 병원에는 누구에게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부부관계 역시 남들보다 왕성하면 왕성했지 뒤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선은 또 한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우석도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답답함은 우석에게도 똑같은 답답함이었다. 우석은 긴 한숨을 지으며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거기서 시원한 음료라도 마시고 가야 할 듯싶었다. - - - “왔나. 이리 들어오거래이.”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부엌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와 마주친 영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괜히 죄지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움츠리듯 고개인사를 하고는 머뭇거리던 영선은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날카롭게 돌아보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는 종종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그러면서 신랑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다. 우석은 차에서 짐을 뺄 겨를도 없이 영선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재털이에서 짧은 꽁초를 집어 들고는 불을 붙였다. 탁한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 올랐다. 영선이 입을 막으며 기침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리고 천정을 향해 한숨 쉬듯이 뿜어냈다. 얼마간의 정적이 흘렀다. 영선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영선은 힐끔힐끔 남편 우석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석은 그녀의 눈총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이젠 내 말 들으러 왔제?” 담배를 비벼 끈 시어머니가 쾌쾌한 담배냄새를 풍기며 따지듯 말했다. “어..어머니..” “와? 또 반항할끼가? 내 죽는꼴 볼라카이?” “그..그게..” 영선의 두 눈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영선은 그런 두 눈으로 남편 우석을 힐끔 쳐다보았다. 우석은 구원을 손길을 보내듯 보내오는 그녀의 측은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어무이, 제 말 좀 들어보이소.” 우석은 고향에만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곤 했다. 처음엔 그것이 신기하게 들렸지만 이젠 그럴 일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무이, 자꾸 그라면 더 안된다카이.” “시끕다. 이 자식아. 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그카나?” “그걸 왜 모릅니꺼. 내도 잘 안다카이. 어무이보다 내가 더 답답하다 안캅니까.” “그란놈이 그리 한가하나? 그래서 여태 내 하란대로 안하고 버텼나? 아?” “그게 아이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방법을 쓰나 이말임더.” “그게 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가. 옆집 며느리 순자도..” “아이 참, 그 말 좀 그만 하소. 지겹도록 들었다 아입니꺼.” “시끄럽다. 너이 둘이서 자꾸 그리 나오면 내도 어쩔 수 없데이. 이 참에 내 죽는꼴 보고 가래이.” “어무이. 어무이.” 영선은 어느새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옆으로 시어머니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렸다. 그 뒤를 우석이 뒤따랐다. 혼자 남은 방에서 영선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우석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우석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영선은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어무이. 어무이. 이러지 마소. 제발 그것 좀 내려 놓으라카이.” “시끕다. 내 오늘 죽는대이. 대도 못잇는 자식 놓고 더 살아서 뭐할끼고.” “어무이. 제발.” 영선은 부엌칼을 들고 손목을 그으려고 서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할말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시어머니 앞에 꿇어앉았다. “어머님.. 흐흑.. 어머님이 시키는데로 할게요. 시키는데로 할게요. 제발.. 흐흑..” 영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항복을 한 것이었다. 우석이 다가와 흐느껴 우는 영선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진작에 그카지. 얼마나 좋노. 니 약속 어기면 안된데이. 알긋제?” “네. 어머님.. 흐흑..” “여..여보..” 시어머니는 그녀의 고집을 꺾었다는 만족감에 겨워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를 들이켰다. 그리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는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흐흑.. 정말 하기 싫은데.. 흐흐흑..” “내..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흐흐흑.. 몰라…” “그냥 딱 한번만 해보자. 저렇게 원하시니까 그냥 딱 한번만…”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