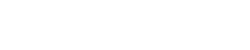그 옆을 어린 태 희가 차지한다. 종 현과 엄마는 조금은 시원한 우목에 나란히 한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시 후,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어린 태 희는 한 번의 칭얼거림 없이 잘 자고 있다. 역시 순둥이란 별명은 아무 아기나 얻는 것은 아닌가보다.엄마도 처음 마신 술 때문인지 옅게 코를 고는 사이 종 현은 오히려 두 눈이 말똥말똥 거린다.
아마 좀 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졸은 탓인 모양이다.엄마는 옆에서 간간히 술기운에 옅은 코고는 소리가 담긴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모처럼 엄마 옆에 누운 종 현은 할머니와 달리 풋풋한 향기가 풍기는 엄마의 몸 냄새에 금방 아랫도리가 반응을 한다.
비록 술 냄새가 조금 섞인 향기지만 이미 여자의 구석구석을 아는 종 현에게는 그 술 냄새가 더 큰 용기를 갖게 만들었다.
자지를 움켜 쥔 종 현의 손은 자지에서 나온 물로 질척거리고 있었다.종 현은 흥분이 되면서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일 년 넘게 할머니의 팬티 속을 드나들던 실력으로 엄마의 팬티를 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의 치마는 할머니완 달리 끈으로 동여매어져 있어서 위에서 침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미 할머니에게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종 현은 능숙하게 치마 단을 들 추 며 아래로 부터 탐험을 시작한다.그런데 이상하다. 엄마의 팬티가 만져져야 할 곳에 삼베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반바지 비슷한 물건이 종 현의 손에 느껴진다.그때 종 현의 기억 속에 두세 달 전쯤인가 할머니와 엄마가 대화하던 말이 떠오른다.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속옷을 얻어왔으니깐 꼭 챙겨 입어란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다.
아마 그때 할머니가 얻어 온 고쟁이를 엄마는 그 동안 꾸준히 입어 온 모양이다. 항상 넘나들던 팬티와 다른 환경에 잠시 더듬거리던 종 현의 손길이 어느 순간 고쟁이의 아래 터짐 사이로 파고든다.
고쟁이는 이래서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종 현은 과감하게 엄마의 보지를 더듬는다.할머니 보지보다 훨씬 부드러운 엄마의 보지털이 반겼지만 무시하고 바로 엄마의 보지둔덕을 지나 골짜기로 스며들었다.
살집이 많이 느껴지는 엄마의 보지가 만져졌다. 할머니 보단 조금 작아 보이는 듯 보지 양쪽의 살들이 잠시 종 현의 손을 막았다.
하지만, 능숙하게 그 살을 양쪽으로 쪼개며 엄마의 보지속살에 손가락이 닿게 했다.
골이 깊은 엄마의 보지에 빨려드는 듯 느낌을 받으며 중지를 살살 움직이며 부드러운 속살의 느낌을 만끽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칠맛에 중지를 더 뻗어 보았지만 엄마의 다리가 더 벌어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를 상대로 충분히 달인의 경지에 오른 다리걸기 실력으로 한쪽다리를 뻗어 엄마의 다리에 걸고는 슬며시 벌렸다.엄마의 다리는 할머니보다 무거웠지만 이젠 나이가 참에 따라 힘이 붙은 종 현의 다리걸기에 조금씩 벌어졌다.
중지가 편해지자 이젠 다리걸기를 멈추었다.
그리곤 바로 엄마의 보지를 다시 탐험하기 시작했다. 종 현의 귀는 엄마의 숨소리 변화에 신경을 세우고 감각은 가운데 손가락에 가 있었다.
엄마의 보지는 할머니보지처럼 그렇게 많이 흐 물거리 지도 않았고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났다.
또한 손가락을 무는 힘이 할머니에 비해 훨씬 강했다. 가운데 손가락을 조심조심 움직이며 위 아래로 긁어주기 시작했다.
엄마는 잠이 들었지만 조금씩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종 현의 또 다른 손에 잡혀 있는 자지에선 계속 물이 흘러나와 손을 적셨다.종 현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자위를 하던 때에 떠올리곤 했던 아버지와 엄마가 빠구리를 하던 장면과 아버지의 자지가 박혀 있던 엄마의 보지를 상상했다.그렇게 한참을 상상의 바다를 헤매고 나자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두려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점점 간이 커지고 대담해졌다.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아버지도 두렵지 않았다. 손가락을 위 아래로 슬슬 움직이자 다시 미 끌 거리며 엄마의 보지가 넓어졌다.
종 현의 중지가 움직임에 따라 엄마의 보지 살들이 일그러졌다.
최대한 살살 한다지만 분명 엄마의 보지가 반응을 하고 있었다.종 현의 중지가 엄마의 보지 입구에 맞춰지자 보지가 순간 움찔하며 종 현의 손가락을 빨아 당겼다.
종 현은 엄마의 얼굴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엄마의 보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미 끌 거리며 너무도 쉽게 쑥 들어갔다. 아니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엄마의 보지 속에 손을 넣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경험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종 현의 손놀림은 너무나 익숙했다.
엄마의 보지 속은 아랫목보다 더 뜨거웠다.
손가락을 조이는 빡빡함 우둘투둘한 느낌의 보지 살들이 종 현의 손가락을 물자 그 느낌이 할머니완 또 달랐다.
한참동안 엄마의 보지를 음미한 종 현은 왕복운동은 자제한 채 손가락만 구부려 엄마의 보지 속을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기 시작했다.가운데 손가락을 깊숙이 밀어 넣고 움직이자 엄마의 보지 살이 종 현의 손가락을 휘감기 시작했다.
보지 속은 깊었지만 탄력이 있었다. 그때 종 현은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다. 아무도 몰라. 어서 올라타...정말 좋을 거야..종 현은 뭐에 씌 인 것처럼 자신의 바지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엄마의 다리사이로 몸을 옮겼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던 대로 잠시만, 아주 잠시만 살짝 넣어보면 될 것 같았다.
종 현은 엄마의 몸 위로 올라가 애 액으로 젖어있는 엄마의 소중한 곳에 천천히 자신의 자지를 가져갔다.
고쟁이의 터진 공간이 넓었기에 아무런 제지 없이 수월하게 그곳에 가져갈 수 있었다.그리고 엄마의 몸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자신의 자지만 엄마의 보지를 겨냥해 천천히 밀어 넣었다.
뿌듯한 느낌이 귀두에 전해지면서 일부분이 엄마의 몸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정확하게 응시했다. 하지만, 엄마의 다른 부분에 자신의 하체를 닿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지의 일부만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게 밖엔 할 수 없었다.
종 현은 만족할 수 없었다. 완전히 한번 들어가고 싶었다. 엄마에게 자신의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게끔 하면서 살짝 몸을 포개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머지 부분도 밀어 넣었다.
이제 완전하게 엄마와 종 현 이는 하나가 되었다. 종 현의 자지는 완전하게 엄마의 몸속으로 사라졌고, 강하면서도 뜨거운 느낌이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 나, 뒤 이어 절정이 다가옴을 느꼈다. 아버지만큼 허리를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런데, 아득한 절정감이 치밀어 오르면서 미처 엄마의 몸속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엄마의 몸에 자신의 씨앗을 뿜어내었다.
본능적인 몸짓인지 몰라도 종 현은 자신의 자지를 엄마의 보지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다.절정감은 한참이나 지속되었다.
자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쾌감과 함께 온몸의 모든 정기가 엄마 몸 속으로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런 사정의 시간이 1~2분은 족히 넘었던 것 같았다.
종 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는 변함없이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종 현은 방금 전 엄마와 한 것에 대해 크게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가 되는 그럼 마음은 없었다.
할머니와의 경험이 종 현의 마음을 무디게 한 탓 인지도 모른다.할머니의 보지를 만지고 난 후, 처 럼 수건을 찾다가 없었다.
그냥 자신의 옷에 손에 묻은 엄마의 보지 물을 대충 닦아내었다.
그리고 바지를 다시입곤 그렇게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까악~ 까악~ 시끄러운 까치소리가 종 현의 눈을 띄웠다.
옆을 보니 엄마는 벌써 일어나 아침밥을 짓는지 부엌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요란하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덜 깨었는지 아버지와 태 희는 여전히 새근거리며 잠들어있다.기지개를 한번 켜고 종 현은 이불을 개어놓은 후 마당을 쓸었다.
1970년 1월 1일의 첫 아침은 종 현의 비질 소리로 시작되었다.
비질소리에 맞추듯 까치 울음소리도 요란하다.
종 현아, 엄마랑 있다가 물 좀 길러가자. 응~엄마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는듯하더니 종 현에게 물을 길러 같이 가잔 말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직 상수도 시설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산골 마을엔 동네 빨래터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때다.
때때로 종 현 이도 물동이를 들고 나른 적이 있었기에 엄마의 말에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얼른 대답한다.
이모님 오늘 하루 더 주무시고 가실 꺼 지 예?오냐.. 하루 더 자고 내일 갈라 꼬 언니하고 엊저녁에 벌써 이야기 댔다.
내일가면서는 언니하고 같이 갈 낀데,
그래도 대제?와 예? 이모님하고 같이 부산에서 좀 쉬시다가 올라 꼬 예?
오냐, 니 이모도 5일까지 쉰 다 꼬 카네.
아들 네미 하고는 며 늘 이 친정집에 갔다 꼬 카이 끼 네 이모 집에 아무도 없다 꼬 같이 며칠 좀 지내자 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