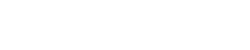젖은 마당에 눕다 <下>
아빠를 옆으로 내렸다지만 내 몸은 아빠와 꼭 붙어 있었다.
혹시라도 아빠의 몸에서 내 몸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필시 아빠는 깨고 말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서로의 몸이 모로 세워진 잠시의 거북한 자세는 아빠가 다시 내 몸 위로 올라 와버림으로 인하여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더 이상 함부로 아빠의 몸에서 벗어나려 애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했다.
오늘 밤 나는 철저하게 아빠의 딸이 아닌 아빠의 아내여야 하니까...
잠시 아빠의 엉덩이가 들썩여대다가 이윽고 멎었다.
어찌할까, 어찌해야 할까?
비가 멎었는지 저벅거리던 발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달이 떴을지도 몰라? 이 시골의 달이 얼마나 예쁜지 다들 모를 거야...
난 그 달에다 자주 소원을 빌었다. 멋진 흑기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멋진 흑기사? 그 빌어먹을 김서방이...?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였다.
하마터면 아빠의 가슴에다 손톱자국을 남길 뻔했다.
그래, 이인 김서방이 아니라 아빠지...! 아빠? 그런데 아빠가 왜? 왜...?
왜 내 위에 올라 있을까? 내 가랑이 속에 들어와 있을까?
하필 나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다 아빠의 은밀한 살덩이를 집어넣고 있을까?
아빠의 살덩이...? 아빠의 자지... 나를 만들 때도 썼을 뜨겁고 성스러운 용두를...
갑자기 내 머리가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느님이 있다면... 이 모습을 내려보고 있다면...
아아, 아버지 안 돼요!
아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꿈적도 않았다.
푸루...푸... 잠이 든 콧바람 소리만 내 목덜미에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손을 뻗어 내 몸과 아빠의 몸이 잇댄 부분을 확인했다.
서로 엉킨 수풀 사이를 비집자 아빠의 뿌리가 만져졌다. 아래로 축 늘어진 주름투성이도 만져졌다.
아빠의 물건이 발기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닌 듯 한데... 아빠의 것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꼭 끼어 있었다. 마치 코르크 마개가 병 주둥이에서 못 빠져 나오듯 아빠의 자지가 내 보지의 주둥이에 물린 채 빠져 나올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였다.
나는 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진상을 더 파악하려 애썼다.
아빠의 뿌리는 시들어 있다지만 머리부(귀두)는 발기한 그대로란 걸 손끝이 확인해주었다. 그래서 코르크 마개처럼 못 빠져 나오고 있는 거 같았다.
며칠 전 옆집 아줌마에게 들은 얘기가 퍼뜩 떠올랐다.
여관에서 헐레를 붙던 두 남녀가 그게 빠지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벌건 대낮에 이불에 둘둘 말린 두 알몸의 남녀를 앰뷸런스에 싣고 가더라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만약 아빠의 것이 끝내 빠지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가야 할 일이 터진다면...???
끔직한 상상이었다.
나는 다급해졌다.
아빠를 깨워야 하는 거 아냐?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 그렇게 해보자! 어느 여성잡지에선가 보니 괄약근에 힘을 주어 남근을 마음대로 끌어들였다 밀어냈다 한다던데...
그 말이 적중했던 걸까? 항문 근육에 잔뜩 힘을 주면서 배 힘을 앞쪽으로 미는 순간 귀에도 들릴 만큼의 "뿡!"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살덩이가 빠져나가는 거였다.
그 음탕한 소리...
천지개벽이 될 뻔한 소리...
그러나 당시 내겐 천만다행한 소리였다.
아빠는 이 다급했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푸루루 푸루루... 코골이만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아빠를 끌어내렸다.
아까처럼 아빠를 꼭 안고 몸을 돌릴 필요는 없었다.
이미 나와 아빠를 동여맸던 은밀한 끈은 끊어졌고 아빠가 잠에서 깬다한들 이제야 어떨까? 그저 꿈속에서의 장난질 정도로 여기겠지...
옆으로 끌어내려진 아빠는 벌렁 누워 잠시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 천장을 향해 콧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평상으로 돌아온 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아빠는 술 취해 잠이 들고, 친정 온 딸은 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는 거다.
그래, 무료한 시골의 밤을 홀로 지새는 거다.
그 사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저벅저벅 다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
엄마일 거야!
아니 김서방이야!
아, 아니 하느님이야...!
내 손가락이 방금 빠져나간 아빠의 감촉을 음미하고 있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다.
이 만큼이야!
아니, 이 만큼이야!
번갯불이 번쩍했다. 그 짧은 순간에 고개를 돌려 아빠의 물건을 확인했다.
물건의 크기를... 그 둘레를... 그리고 번떡이는 광채를...
감사하고 싶었다.
저것이 순순히 빠져 나오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손아귀로 살며시 거머쥐었다.
몸을 반쯤 일으키며 그 끝에다 살짝 뽀뽀를 했다.
"고마워요, 아빠...!"
......어떤 상황였을까?
이랬을까? 이랬겠지...?
버섯 모양의 굴곡 부위가 입술 언저리에 물려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이처럼 좀체 놓아주지를 않는...!
화들짝 놀라 입안에 걸 뱉어내고 뒤로 물러났다.
방안을 더듬어 아빠의 옷을 찾아 조심조심 입혀드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벗겨져 나간 내 아랫도리도 찾아 껴입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이쪽 끝으로 자리를 옮겨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랑이 속의 아빠가... 아빠의 그 묵직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그때 좀 더 느낄 걸... 좀 더 즐길 걸...! 이런 당돌하고 음흉한 생각들이 자꾸 날 달구는 거였다.
......아빠는 아직도 곤한 잠 속에 빠져 오히려 평온하지만
......이 딸은 도무지 아빠의 흔적을 떨쳐낼 수 없어 혼란하네요!
밖에서 와르륵 와르륵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컴컴한 벽에 기대어 가랑이 속 아빠의 흔적을 쫓아가며 손가락을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모를 우릴 훔쳐보는 저벅저벅 발소리에 쾌감을 돋워가면서............
나는 이미 비에 흥건한 마당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끝>
첫 작품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 이미 떠나신 그 분이 그립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하늘로 가셨는지?
바다로 가 고기의 피와 살이 되었는지?
그게 다시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의 피톨로 살고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판단으로도 가름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아직도 내 가슴속에 머물러 있는 건 확실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는 픽션입니다. 앞으로의 글 모두도...
감사합니다.
-눈만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