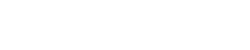뒤로 넘어진 지영이를 올라탄 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우선 지영이의 목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가녀린 동생의 목은 누군가가 손만대도 부러질 것만 같이 가녀렸지만 그 목에서 지영이의
특유의 냄새가 묻어나오는 것에 내 흥분은 점점 끓어 올랐다. 여자의 목이 이렇게 선정적이었나 할
정도로 지영이의 것은 내게는 색다른 매력이었다.
"오빠....아흥..간지러워....."
귀엽게 앙탈까지 부리는 지영이. 난 지영이의 말대로 목에서 고개를 덜어 누나보다는 덜하지만 그
래도 여자라고 부르기 충분하게할 정도의 가슴으로 향했다. 그 누구의 흔적도 허락하지 않던 지영이
의 언덕이 뽀얀 살결을 이미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일까. 난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
의 가슴을 천천히 주물렀다.
"아흑....오빠....나 이상해지는 것 같애...웬지 기분 좋아...아으응...."
나말고는 그 누구도 지영이의 가슴을 이렇게 만질 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것은 일종의
정복욕이자 나만의 것이라는 독점욕까지 더해져 나를 기쁘게 했다. 평소의 나였다면 절대 못했을 생
각이지만 이미 난 야수가 되어있었고 꺼리낄 것도 없었다. 손가락으로 살살 유두를 굴리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볼록 솟아 올랐다. 그에 비례하며 지영이의 콧소리도 점점 높아져갔다.
"하응....으으응....하아....후우.."
지영이가 숨을 헐떡일때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내 손안에 잡힌다. 만져도 만져도 질리지 않
는 나만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지영이의 가슴. 매끄러워서 더 힘것 잡아버리면 놓쳐버릴 것 같아 난
조금씩 힘을 빼어 혀로 핣기 시작했다.
"아아악. 간지러운데....뜨거...워져. 내 가슴이....흐응..."
"으음....."
누나와는 다른 정말 풋풋한 살내음. 난 그런 지영이를 더 느끼고 싶었고 갖고 싶다는 바램이 커져갔
다. 지영이도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 싫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의 진도도 괜찮을 듯
싶었다. 난 솟아오른 유두를 잘근거리며 깨물었고 바로 반응이 나왔다.
"하아아앙~ 오...오빠....시..싫어.....으으음..."
지영이가 언젠가 아기를 나오면 여기서 우유가 나오겠지. 그런 상상에 난 마치 아기가 된 것처럼 그
가슴을 빨면서 내 손을 놀게 놔두지 않고 지영이의 배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쓸면서 성감대를 찾아
다녔다. 내 손이 지영이의 허리 옆을 지나며 스윽 스쳐가자, 더는 참지 못한 지영이는 허리를 튕기며
자지러듯이 비명을 질렀다.
"아아아아아아~ 오빠. 안돼..거긴....아흑....흐으으응.....나..이상해져 버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싫다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가 좋으니 더 해달라는... 지영이의
성감대가 여기였구나. 난 지영이의 양쪽 옆구리를 만지작거리며 유두를 쪽쪽 빨았다.
"아으응...안된다고..했는데..너무해...하아..하아아..."
"너도 좋잖아...내가 이러기를 바라잖아...안그래?"
"부끄럽게...그런 말 하지마....제발...."
지영이는 정말로 울것같이 훌쩍이면서도 내 행동 하나 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다. 내 손이 허리를 내
려와 비밀스런 골짜기에 도달하자 이미 그것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잠시 대기만 했는데도 지영이의
애액이 내 손안에 묻어나오는 것이 느껴져 나는 그것을 지영이의 눈앞에 드러냈다.
"어때? 벌써부터 내 좆을 달라고 보채는 거야? 앙~?"
"흐으으응.... 싫어.... 으으응.....아아아아....좀....더...."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으으.....조....좋아..."
조그맣게 속삭이는 지영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난 지영이의 애액을 가슴에 발라서 혀로
그것을 핣았다. 새콤하면서도 싸싸름한 맛이었지만 난 지영이가 들리도록 소리를 더 내며 애무했다.
자극을 받은 것일까. 지영이의 보지에서는 아까보다 더 진한 애액이 넘쳐 흘렀다. 이미 바닥이 흥건
해질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결심한 나는 지영이의 다리를 내 어깨에 걸치고 내 페니스를 지
영이의 보지로 맞추며 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오빠....살살...살살해줘. 나 오빠가 처음이야. 그러니까....아아아아앗!!"
"크윽...역시...꽉 쪼이는군....아윽."
누나하고 할때와는 정말 천차만별이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탓인지 지영이의 보지는 충분히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아으으윽....오빠...아파...아파...으윽....너무....아아악."
잠시 뒤로 뺀 뒤에 다시 진입하자 이번에는 반 이상 들어갔다. 지영이는 정말 아픈듯,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맛본 여자에 대한 내 욕정은 난폭하기만 했고 난 억지로 지영이의 안으로 뿌리까지 들
어갔다. 낯설은 이물질에 놀란 듯이 지영이는 몸을 좌우로 틀면서 팔을 휘저었다. 그러다 내 양팔을
잡으며 아픔을 참으려 했다.
"으윽....대..대단해. 내 안에...오빠의 그게...들어와....하윽...살살...살살 움직여.."
"하아...하아....아아.."
서서히 허리를 움직이자 내 움직임에 조금씩 적응을 한 지영이도 어설프나마 허리를 흔들며 나의
움직을 맞춰나갔다.
-푹 푹 척 푹 척 질컥 질컥-
"하응....오빠...어때? 좋...아?"
"응...꽉 쪼이는게...미칠 것 같애."
"오빠가..좋으면.....더 해줘. 나..참을 수 있어. 하아악..."
내 페니스가 지영이의 페니스를 휘저으며 허리를 돌리자, 지영이는 표정을 찡그리면서도 나를
원했다.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자 지영이의 처녀막이 터지면서 나오던 피가 바닥 이리저리 튀기며 약
간은 끈적거렸지만 우리의 섹스에는 지장이 없었다. 차츰 약하게 하다가 기습적으로 뿌리까지 집어
넣자 지영이는 입을 벌린채 숨도 못쉬며 나를 끌어안았다. 켁켁거리며...
"아아아아앙~! 반..반칙이야...이런거. 아프단 말야...하응.."
"하지만 네 아래에서는 대답이 틀린걸....으으..하아.."
그랬다. 오히려 환영하는 듯 나의 페니스를 잡고서는 놓아주지 않을 정도로 지영이의 질 안에서
는 엄청난 수축으로 내 페니스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숨을 몰아쉰뒤 지영이에게서 떨어
져 나왔다. 지영이 보지에서 나온 페니스는 애액으로 번들거리며 윤기가 흘렀다.
"하아..하아...왜...꺄아"
지영이를 뒤집고서 아무 말 없이 다시 내 분신을 진입시키자 지영이는 고개를 쳐 올리며 나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영이의 엉덩이가 내 사타구니에 부드러운 쿠션 역활을 하면서 기분이 최고
였다.
-뿌직 뿌직 척 척-
"하아아앙...이..이것도...좋아. 오빠...기분이..아래가 뜨거워.."
"흐흐....."
나는 더욱 속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럴수록 지영이도 못참겠다는듯이 비영이 끊이지를 않았고 그
목소리마저 떨려갔다. 그리고 서로의 절정에 거의 다가가고 있었다.
"아아아아~ 오..오빠. 나 더 이상..안돼...."
"나도...더는....안에다 싼다~"
"하아아아~그..그러면...아기가....아아아아악~~!!"
-뿌직 뿌직 춧-
드디더 절정의 쾌감에 다다른 순간, 나는 사정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영이의 안에다 뜨거운 정
액을 퍼부어줬다. 절정에 버티지 못한 지영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고 나도 지영이
에게서 떨어져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는 약의 성분에 못 이긴채, 다시 지영이에게 덥쳤다......
"으...으음...."
"정신이 들어? 어때, 기분은?"
"윽...머리 아파...."
"나빴어. 나하고는 두번 밖에 안해줬으면서 지영이는 세번이나 하다니. 걔 지금 앓아 누울 정도야."
"뭐? 세...번? 내가....지영이랑?"
아아악~ 이젠 진짜 막나가는구나. 누나에 이어 이젠 여동생에게까지. 남은건...어머....아앗~ 안돼.
나는 머리를 쥐어 뜯으...얼레? 다시 묶였잖아. 나는 눈을 부라리며 누나를 바라봤다. 누나는 내 시선
에 의아해 하다가 의미를 이해하고는 살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을 먹었을 때는 네가 달아날 걱정은 없지만 약 기운이 풀리면 상황이 달라지거든. 지영이가 끊나
고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묶었지. 지영이 나올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있지? 키킥."
뭐가 웃기다고 저리 실실 쪼개는지...이러는거 당신 부모도....아. 같은 부모지. 이젠 먼 나라 얘기 같
지만. 에휴.
"날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둘 셈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나 진짜 죽을 맛이라구."
"흐음~. 글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때. 너도 이젠 점점 적응이 되가잖아. 사람은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니까 더 무서운 거라구. 근친 간에 사랑도 이렇게 하고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니."
누나는 자신의 말대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까지 주입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네. 난 아직은 정상이란 말야. 아직까지는....
"웃기지. 생각해보면... 귀엽기만한 하던 동생에게 이런 사랑 같은거 느끼다니. 근데..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연인 관게도 그 사람에게서 호감을 느끼고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랑도 깊어지는
거라잖아. 하물며 우리는...."
"하지만 우린 혈연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모르잖아. 아니..아시면....."
울컥 내 처지가 슬퍼졌다.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아시게 되는 날에는 정말 어찌 되는 걸까. 아무리
무심하시던 사람들이지만 근친상간이라니. 그걸 예상했다면 그게 더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지영이나 나나 다 너를 위해서 그런거야. 지난번에 그 계집애 보다 우리가..."
"닥쳐~! 한번만....한번만 더 수지 욕하면 가만 안둘거야. 진짜로...."
내 위협에 누나도 놀랬는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누
나 말대로 생각만 달리하면 이 상황이 그리 나쁜 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난 그럴 수 있는
트인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수지는 별개의 문제. 동생을 이런 식으로 강간..일라나. 암튼 이렇
게 부려먹는 여자에게 수지의 이름을 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하아...수지야. 보고 싶다. 너의 그 천
사 같던 미소는 이젠 아른거려서 보이지 않아. 그동안만이라도 너에게 더 잘해줄걸.
"알았어. 네 그 잘난 여자친구는 얘기 안할게. 넌 차츰 잊어갈 테니까. 왜냐하면...이렇게 예쁜 누나가
있잖아. 항상...항상 널 바라봐 왔어. 10년? 아니...너 태어날 때의 모습조차 내가 봤어. 세상 누구보
다 널 사랑해. 엄마?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널 보살폈어. 근데..왜 넌 그걸 알아주지
않니?"
"............"
누나가 저리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사업상이라고는 해도 우릴 거의 팽개치다시피 한 부모님. 그
런 우리...아니 나를 보살펴 준 것은 내 누나뿐이었다. 내가 맞아서 들어올 때면 바로 나가서 응징해
주던 나의 흑기사 같은 존재. 중학교때 사춘기로 맘고생 했을때 날 위로해 주던 사람이 누나였지만
그 마음에 전혀 다른 감정이 있을 줄이야.
"잠시 쉬어야 겠지. 저녁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계장 해놨는데."
"계장...... 싫어. 또 거기에 약 탔지?"
"어머..얘는. 너 그렇게 무리하고 또 먹일 것 같니? 네가 변강쇠도 아니고, 그걸 무슨 수로 버틸라구
그래. 걱정마. 이번엔 안넣을 테니까."
휴....그럼 넘어가는 거야? 자...잠깐.
"어이. 일단은....이라니?"
"응? 글쎄. 난 모르겠는데....."
"으악~ 또 먹일라구 그러지~! 치사하게 먹는걸로 그러냐~ 너무하잖아."
누나는 한쪽 눈을 윙크하며 일어섰다.
"그럼 그 다음은 후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일종의 디저트. 후후."
"디저트 세끼 먹다가 복상사하겠구만. 쳇."
누나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식사가 나왔다. 이미 묶여있는 몸이라 누나가 내 시중을 들어줬지만 전
혀 반갑지 않는 서비스다.
"자...앙~. 옳지. 잘 먹네. 이번엔 당근무침 먹을까?"
"으윽. 당근은 실어. 딴거 줘...."
"안돼. 야채도 꼭꼭 먹어야 한단 말야. 자..앙~"
젠장. 진짜 반갑지 않은 서.비.스.다. 누나는 내게 당근무침을 먹이며 죽을상을 하는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이봐요...난 누나의 애완용이 아니란 말야.
"이러고 있으니 신혼 부부 같지 않니? 내가 떠주구..넌 그걸 먹구. 후훗."
"아....그러네요."
그 대사 아까도 들었지. 안닮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닮았네. 이 자매. 그러니 작정하고 날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도 갈수록 거부감이 적어지는 나는 또 뭐냐. 우리 가족 전체가 이렇단 말인가. 아아악.
적어도 난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나는 누나와 지영이에게 시달리며 은밀한 생활을 계속해갔다. 하루라는 시간 관념도 나라
는 존재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시간.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방안에만
있다보니 해는 떴는지 계절이 바뀐 것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식사중에 약을 먹거나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는 다시 눈을 뜨면 반복. 내 몸이 정말이지 내 것이 아니게
되어간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걸까. 언제까지...?
"오빠~ 오늘은 어때?"
"뭐..항상 그렇지."
힘없이 말하는 내가 안돼보였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지영이. 내 옆에 슬며시 앉고는 요즘 티비
에서 유행하는 개그등을 하며 나를 웃기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금세 포기해버린다.
"요새 오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애."
"그런가.... 너도 당해보면 내 맘이 어떨지 조금은 이해할텐데."
한창 나이인 누나야 그렇다치더라도 지영이도 여자라는 것에 눈을 뜬 것일까. 어떨때는 누나보다
더 할 때가 있다. 아니..어쩌면 누나에게 지지 않으려는 이상한 승부욕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끔 어
느 한쪽과 더 많은 시간동안 할라치면 바로 다음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니...
누나는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있어서 섹스하는 동안 여러가지를 나에게 가르쳐주며 섹스에
한동안 빠져 산다. 정확히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지영이와 할때에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나오
는 것을 안 지영이도 자기도 지지 않는다며 이상한 정보등을 듣고 와서는 내게 이것저것 실험하는
데... 난감하기만 하다. 마루타도 아니고 말야. 지금 세상에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다니. 하지만 때로
는 나도 이런 생활에 서서히 젖어들어간다. 그저 그려려니... 때로는 둘의 육체가 그리워 사무치기도
할 정도다. 훈련받았다고 해야 하나. 조금씩 내게서 그것이 눈을 뜨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니가 그랬어. 언제가는 오빠도 우리 맘을 알아줄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지
오빠? 나...싫어하지 않을거지?"
커다란 눈에 내 모습이 비춰진다. 많이 초췌해진 내 모습. 밥은 먹고 사냐는 누구의 말이 문득 떠
오른다. 밥이야 먹지. 그 이상의 열량을 소비해서 문제지만.
"알았으니까 약이나 먹여."
주저하던 지영이는 품 속에서 약을 꺼냈다. 저걸 도대체 얼마나 먹었을까. 밥보다 저걸 더 많이 먹었
던 것 같은데. 지영이가 내 입에 약을 넣고는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려하자 나는 얼굴을 돌렸다.
"오빠....."
"어차피 이제 하게 될 거잖아. 뭘 서두르고 그래."
"응....그러네. 그러면...슬슬..."
슬슬 내가 약이 퍼질 시간이 되자 지영이가 밧줄을 풀었다. 그래...내가 노린 것은 이거다.
지영이는 아직 어리광이 남아 있어서인지 섹스할 때 내게 묶여 있는 밧줄을 풀어 자신을 안아주기를
원한다. 사람의 품이 그리운 거겠지. 반대로 누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를 리드하면서 자
기가 만족할 때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틈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때. 이 자매들이 모르
는게 하나 있었으니 인간은 바로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
어느샌가 지속적으로 약을 먹다보니 면역이랄까. 예전의 양으로는 그리 쉽게 흥분되지 않았다. 하지
만 나는 머리를 굴리며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내가 이 약에 조금이라도 강해
진다면 그 때 도망가기로. 그 시기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물론 지금 난 아직 약에 의해 흥
분되지 않은 상태. 정신도 말짱했다. 이 때를 위하여 맨정신으로 누나와 지영이의 몸을 섞던 그 고통.
거기서 나는 해방되는 것이다. 이윽고 줄이 풀려 지영이가 나를 안으려 하자, 나는 있느 힘껏 지영이
의 뒷 목을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지영이에 이어 소리를 들은
건지 누나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아....? 무슨...캬악~!"
-쾅-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누나를 향해 젖혀진 방문을 있는 힘껏 닫았고 그 반동에 누나의 머리와 문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꽤나 아팠을 거다. 피라도 안 나오면 좋으련만. 고통이 심한지 누나는 머리
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바닥을 굴러다녔다. 내가 줄을 꺼내어 누나의 몸을 묶자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누나는 소리 지르%